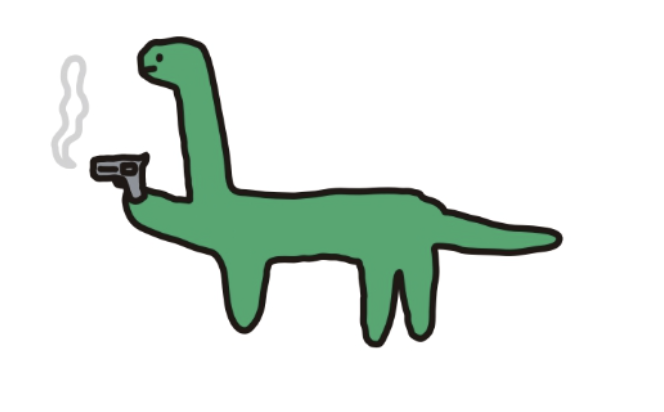어떤 책은 그 책의 언어를 빌려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아름다움을 전할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든다. 내겐 이 책이 그렇다. 미학과 공연예술학의 관점으로 삶과 우주를 밀도있고 용기있게 바라본 글이며, 작가가 인용한 많은 극작품에 대한 해석도 무척 흥미로웠으나 나는 무엇보다 글쓴이의 관점을 사랑하게 되었다. 소멸이라는 삶의 필연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남겨질 노래와 몸짓, 보이고 흘러가는 것들의 의미를 아득하게 파악하는 이 시선을.
언어와 인식의 관계를 고찰할 때 소쉬르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기호는 ‘기표’(signifiant, 겉으로 드러나는 기호의 형식) 와 ‘기의’(signifié,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기의에 대해서도 기표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곤 한다) 그 사이에는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언어 체계 하에서만 필연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내가 영어 화자라면 네모낳고 단단하고 책장이 넘어가는 이상한 물체를 ‘book’이라고 부르기로 ‘정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언어는 한 발짝 느리다. 번개가 친 후에 천둥 소리가 울리듯, 순간의 느낌이 육체를 훑고 지나가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를 표현할 언어를 찾고자 골몰한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동시에 소멸하는 공연과도 같은 생을 살아가며 많은 순간 사람들은 이를 표현할 적절한 기표를 찾지 못한다. 그저 그때의 감각을 느꼈던 나의 감정 상태만을 옅게 기억할 뿐, 어떠한 순간도 그와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류의 모국어는 어쩌면 차라리 침묵일지도 모른다.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챕터를 고르자면 '관객 학교' 와 '꽁띠뉴에'이다. '관객 학교' 에서는 공연예술학을 공부한 작가가 관객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 그리고 관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고찰한다. 예술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아주 면밀하게 다뤄 내가 접하는 모든 매체와 음악, 작품들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다. '꽁띠뉴에' 에서는 그 전 챕터 '비극의 기원'에 이어 여성학을 공연예술의 관점으로 다루며 세상에 남겨질 모든 노래는 누구도 상처입히지 않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아래에 필사한 문장의 일부를 남긴다.
어쩌면 극장에서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체성은 관객의 주체성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매순간 무언가를 바라보고, 이미 본 것과 지금 본 것을 연결하며, 그렇게 펼쳐가는 의식의 지형도로 생을 꾸리고, 자신을 구축한다. 이때 바라보는 일이 그저 매끄럽기만 하다면 생은 아프지도 아름답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시선은 때로 무언가에 막히고, 충격으로 아득해지고, 성찰의 거리를 취하고, 다시금 용기와 다정으로 몰두하고, 기필코 뒤돌아 나 자신을 또한 응시함으로써 굳건해진다. 그리고 어떤 예술은 이 같은 시선의 아찔한 편력을 돕는다. 종종 그런 작품은 '스캔들을 일으킨다' 고 말해지는데, 스캔들의 어원인 스칸달론(skandalon)은 '발을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 를 의미하며, 이때 넘어지는 것 역시, 시선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p.55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워 않고 스스로 느끼는 좋음과 나쁨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움을 요청한다면. 보다 섬세한 사유와, 대상화하지 않는 예의와, 고유한 형식미를 갖출 것을 우리가 작품들에 요구한다면. 그 형식들이 다채로워지고, 관객은 그 하나하나의 힘을 바라보고, 의미를 풀어내고, 그래서 언젠가 오직 관객이 좋다고 하는 연극이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삼백 년쯤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삼백 년 전의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고 싶던 꿈. 그런 꿈이 내게 있었다.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p.56
...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 자신조차 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관객에게 사유와 비판을 가능케 하는, 여러 겹의 진실이 필요하다. 그 틈새 속에 누구든 은신하여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섬세한 깊이가 필요하다. ...(중략)... 시간에 기대 한 공연이 흘러가버린 뒤에도, 세계는 세계의 아픔을 안고 남아 있다.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p.87
우리는 다만 노래를 멈추지 않으면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어떤 노래일 수 있을지를 끝없이 성찰해야 한다.
계속 노래하라는 말이 누구에 대한 폭력도 아니게 될 때까지.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p.93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이 책을 권한 친구의 얼굴과- 나의 삶에서 소중했고 소중하고 그럴 예정인, 어떤 것이든 빚져 나를 이룬 모든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더불어 학부 1학년때 들었던 공연예술 강의를 생각하고 그때 쓴 글들을 다시 읽었다. 삶을 바라보는 지평을 스스로 고민하고 날카롭게 벼리고 확장시켰던 종류의 시간들. 교수님의 강의력과 상관 없이 나는 실라버스의 텍스트를 즐겁게 탐독했으며 과감하게 해석하고 비평했었다. 그 흔적들을 발견하며 다시금 아득한 희망을 품었던 대학 시절로 돌아가 보았다. 나를 뒤흔들거나 지었던 모든 순간의 밀도를 셈하며.
+)책은 얇은 편이다. 그러나 실체가 없이 지나가버린 모든 아픔과 아름다움에 대한 남겨진 헌정시같은 문장들이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등장하기에 읽는 시간은 꽤나 오래 걸렸다. 갤러리를 관람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을 관조하는 마음으로 좋은 문장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다.
++) 아 그리고 이 책을 읽다가 "드라이브 마이 카"의 감독인 류스케 하마구치의 다른 영화인 "해피 아워"(2015) 가 갑자기 생각났다. 다섯시간이 넘는 영화 중에 행복의 무게중심을 찾아보자는 워크샵을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메시지와 관계 없이 행복의 균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서로의 몸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연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때문에 생각이 났던 듯.
'책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작은 파티 드레스 (크리스티앙 보뱅, 1991) (0) | 2023.04.08 |
|---|---|
| Why Fish Don't Exist (Lulu miller, 2021) 리뷰 (0) | 2023.04.08 |